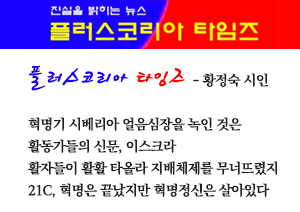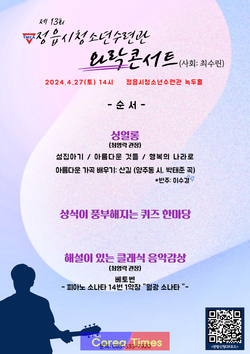|
[박종규 단편소설] 초 록 반 지 (1회)
뽀유스름한 연병장에 갑자기 자드락비가 내리꽂힌다. 우기에 들어선 병영(兵營)의 늦은 밤. 중대 막사 앞 가로등 밑에는 전투모를 깊이 눌러쓴 김 중위가 우뚝 서 있다. 지휘봉을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적당히 벌려 붙박이가 된 자세는 사람이 아니라 돌조각이다.
주황색 가로등은 그의 뺨과 군복에 내리긋는 빗줄기를 황금 빛살로 바뀌어 놓고, 모자에서는 중위 계급장이 차갑게 번뜩인다. 빗물은 모자챙을 타 돌아 귀밑으로 줄 줄줄 흘러내리고, 비옷도 없이 장대비를 받아내고 있는 김 중위의 모습은 자못 비장감마저 느끼게 한다. 늦은 시각, 이런 궂은 날씨에 부대원을 집합시켜놓고 왜 저리 서 있을까? 이제 무엇을 어쩌자는 것일까?
“2구대 전원 집합 끝!”
내무반장의 당찬 목소리는 빗줄기를 뚫고 밤하늘로 솟아오른다. 부산한 움직임들이 멈추고, 네 줄로 정렬한 대원들은 알 철모 팬티 바람에 소총을 비껴들고 덜덜 떨고 있다. 알 철모에 떨어지는 굵은 빗소리는 대원들의 가쁜 숨소리마저 눌러버린다.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철모가 머리에 고정될 수 있도록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진 속 철모, 그 속 철모를 빼버리면 알 철모가 된다. 알 철모만 쓰면 머리가 철모 속으로 쑥 들어가 콧등까지 얼굴을 가리게 된다.
한바탕 소나기였을까? 홀연 빗줄기가 잦아들며 주위가 조용해지자 막사 옆으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더욱 요란을 떨고 있는데, 투 투 투드득! 다시 빗줄기가 알 철모를 찍어대기 시작한다.
“주목해라!” 김 중위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대원들을 훑어보다가 낮은 톤으로 입을 열었고, 빗살 사이로 전해지는 목소리는 음산하기 짝이 없다. 예전에 보았던 흑백영화 드라큘라의 분위기다. 빗물은 그의 모자챙에 모여 어른거리다 이젠 콧등을 타고 내린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입술만 움직이는 김 중위는 차라리 로봇이다.
이 자가 또 무슨 꿍꿍이일까? 저 웬수는 감기도 안 걸리나. 그러나 김 중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하다.
“귀관들, 내 말 잘 들으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나를 만나 유난히 고생했을 텐데, 나라고 귀관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리했겠는가? 그건 아니었다.”
어럽쇼!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꿍꿍이속일까? 이 빗속에, 이 꼴로 집합시킬 때는 언제고……. 구대장 김 중위는 지금 어울리지 않게 감성적인 말을 끄집어내고 있으니 말이다.
가살맞다! 이치는 바로 목석이었다. 이성적이거나 이지적인 인간과는 거리가 먼 냉혈한이었다. 감성이 개입할 틈이 보이지 않는 대쪽이지, 사람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특수조직에서는 이런 인간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대장으로 선임한 것이려니 받아들이면서도 불평들이 난무했다. 부대를 지휘 통솔하려면 나름의 덕목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김 중위에게 덕목이란 말 사치일 뿐이었다.
그런 작자가 궂은 밤중에 피곤해 떨어진 대원들에게 비상인지 나발인지를 걸어 알 철모로 집합시켜놓고 어울리지 않는 말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필시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개 소린 집어 치우고,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의 입술이 다시 기계처럼 달싹이기 시작한다.
“피곤한데 왜 깨우느냐고? 그 딴 민간인 같은 투정은 용서 없다. 군인은 모름지기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동료나 부하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용광로에 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전쟁은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피곤해 있을 때,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를 적들은 기회로 삼는다. 더구나 우린 장교 후보생이다!”
뻔한 내용! 누가 그것을 모를까.
연병장에 촘촘히 줄지어 박아 놓은 말뚝들 등짝에 거센 비바람이 후린다. 빗물이 알몸을 타고 흘러내려 팬티 속으로 스멀스멀 기어드니 오싹 한기가 돈다. 이젠 사타구니마저도 식혀 내린다. 뒷줄에서 들리는 재채기에 이어 또 다른 누군가가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재채기 소리를 죽이고 있다. 김 중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해서 빗소리가 반을 잡아먹고 있다.
“그리고… 바라건대, 귀관들은 날 오해하지 마라.” 구대장은 돌연 말을 뚝 그쳤고, 이 삼 분간의 침묵에 빗소리가 파고든다. 입을 한일자로 그은 구대장은 대원들을 골고루 둘러보더니 왼 손을 올려 모자챙에 흐르는 빗물을 천천히 쓸어내린다. 아주 천천히… 그때다. 앞줄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한다.
“어?” “아!” “아니…”
“저, 저 치가 정말?” 그의 행동을 주시하던 후보생들은 너나없이 속으로 탄성을 지른다. 그건 상상할 수 없었던,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규 관련기사목록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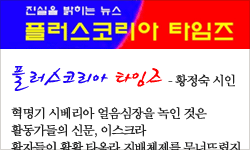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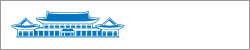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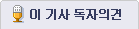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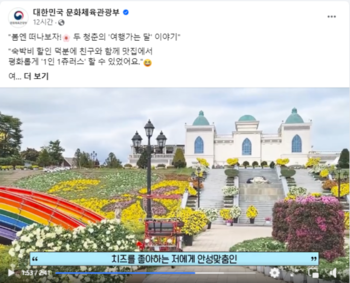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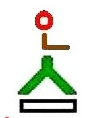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