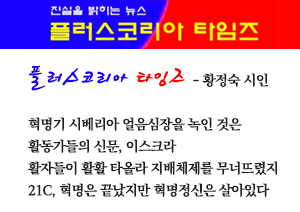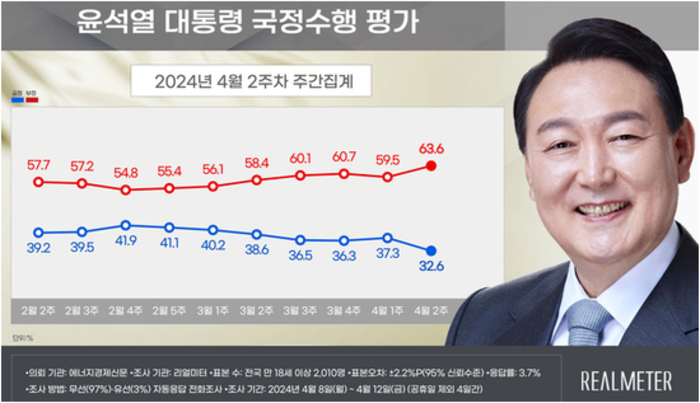|
“남편은 뭘 하세요?”
“춤꾼이에요.”
주저함이 없이 대뜸 나온 대답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주위가 일순 조용해졌다. 그녀의 용모에 서 피어오르던 갖가지 상상들이 단번에 사그라졌다.
“춤꾼? 댄스 강습 같은 것 하시는 모양이네?”
“아니, 그냥 여자들 꽤서 춤추는……. 나쁜 사람이에요.”
또다시 짧은 침묵이 흐른다. 일행들이 여인의 말을 순화시켜 들으려 하나 본인은 일을 더 키우는 꼴이었다.
“……?”
“설마하니 제비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맞아요, 제비족…….”
“!”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대목에서야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있었다.
“……설마.”
그녀는 모처럼 말 걸만한 상대들을 만났다고 생각하는지, 못할 말이 뭐 있느냐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한 술씩 더 떠가는 그녀의 말 마디마디가 파격이었다. 시원한 눈망울에 깃든 청순 이미지, 그러나 그녀의 예쁘게 도드라진 입에서 거침없이 까발려지는 속사정! 그녀에 대한 곽진설의 그림은 초록색과 무채색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제 남편은 서울 강남의 여인들을 등쳐먹는 제비족이에요. 혹시 모르니 사모님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설마하니…….”
“그럼, 돈도 많이 생기겠네요.”
누군가가 말을 받았다. 그녀의 말투를 되받는 대답이었지만 여인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돈이 있을 때는 몇 달이고 간에 내려오지 않아요. 서울에서 좀 돈 쓸 일이 많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때가 좋아요. 돈 떨어지면 쪼르르 내려와서는 라면 판 푼돈까지 긁어가니까요!” “저런, 인간이라니.”
“사람도 아니구 만!”
“제비족 상대 가운데에는 돈 많고, 잘나가는 알 만한 집 부인들도 있는데 대부분 오십 줄은 되어 보여요. 정선까지 데려와 모텔에서 함께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집에까지 들여와 같이 자면서 나를 밖으로 내몰아요.”
여인들은 말 같지 않은 말이었지만, 한 마디 한 마디에 눈빛이 달라지곤 했다.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그리 살고 있어요?”
“믿기지 않는 말만 하는데,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원!”
“한 번은 데려온 여자를 사모님이라 하면서 닭죽까지 쑤어 올리라 했어요.”
특이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면서도 여인은 대수롭잖은 표정이라는 것이었다. 부인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여인도 있었다. “그래서 닭죽 쑤어 올렸어요?” 언성이 꽤 높아진 질문이었으나 그녀의 말투는 여전했다.
“그래야 편해요. 할 수 없었지요.”
“정말 더는 못 듣겠네!”
“세상에나!“
“저런! 어떻게 세상을 그리 살아요, 그래? 둘 다 간통죄로 쳐넣어 버리잖고. 어이구 답답해 더는 못 듣겠네! 내가.”
부인네들은 씩씩거렸고, 벌린 입을 계속 벌린 이도 있었다. 이 여자는 바보고 멍청이인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반반한 얼굴에 어쩌다 저리되었을까? 그러나 여인의 천연덕스런 말은 계속되었다.
“돈푼깨나 있고, 세도나 학식 있는 부인들이 정선 땅에까지, 나이도 한참 아래인 사내를 쫓아 내려와 지내는 모습, 정말 꼴사나웠어요. 얼마 전에는 육십이 넘은 여자도 있었는데, 나잇값을 하는 건지 너무 거드름을 피웠어요. 남편이 힘깨나 있는 여자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고소를 하자니 남편까지 다칠 것 같아 그냥 팔자려니 생각한답니다.”
듣고 있는 일행들의 호응을 즐기는 것인지, 여인은 시댁 부모들까지 이 라면 장사 여인에게 얹혀살면서도 상식적으로는 이해 못 할 정도로 그녀를 들볶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래도 부모로 알고 모든 수발 다 든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미쳤어!”
“제정신으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네.”
“그렇게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정말 어디 좋은 구석이 있는가 보지.”
열이 바짝 오른 부인들은 남편이 듣건 말건 저마다 한마디씩 해대면서 그녀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했다.
“두 자식이 있는데 어쩌겠어유? 팔자려니 살아야지 유.”
“고향이 충청돈 갑네!”
“아니에요. 아버지 따라 논산에 내려가서 고등학굘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 가끔 호남 쪽 말투가 나와유. 제게도 낙은 있어요. 착하게 커 주는 두 아이가 있고, 제 어려운 처지를 알아주어 이 장사라도 맘 편하게 하도록 배려해주는 면사무소 직원들! 또 하나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녀는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하나님? 그렇지! 종교가 이 여인에게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어떤 초인적인 의지의 대상이 없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그같은 처신은 불가능했으리라. 곽진설은 시선에 들어온 그녀의 모습에서 기독교인들 특유의 분위기를 감지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부인네들의 반응은 마냥 거칠기만 했다.
“말도 안 돼,”
“그 인물에, 당장 헤어져요.”
“천사와 미친놈이 같이 살고 있고 만!”
“모든 것을 제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어요. 남의 일이니 너무 흥분들 마세요. 이 자리 떠나시면 그냥 잊을 이야긴데.”
너무 천진한 건지, 바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열을 받은 건 도리어 부인네들이었으니. 그때 묵묵히 듣고 있는 남편들 가운데서 곽진설을 가리키며 말을 자르고 나서는 인물이 있었다. “기가 막히는구먼! 참, 여기 이 사람이 소설 쓰는데 내가 보기에 충분히 글 깜이 될 것 같네요. 자네 언제 다시 한 번 내려와 아주머니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정말, 그럴싸하겠어요!”
부인들도 맞장구를 쳤다. 소설을 쓴다는 말이 나와서야 안쪽의 두 사내가 고개를 들더니 이쪽으로 눈길을 한 번 보냈다.
“그러세요. 한 번 시간 내서 내려오세요.”
여인도 곽진설을 다시 쳐다보며 말을 받았다. 소재가 될 만한 이야깃거리였다. 남편의 캐릭터도 그렇고, 모든 것을 품는 이 여인의 성품은 도덕 불감증이 만연한 사회에 경종이 될 만도 했다. 그 집을 나서서 서울에 오는 동안에도 일행은 정선에서 들은 이야기의 소설화에 대해 거듭거듭 화재를 만들어 내곤 하였다. 진설은 그녀에게 한번 다시 들리노라 했지만,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속내를 쉬 드러내 준 여인의 심리상태에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규 관련기사목록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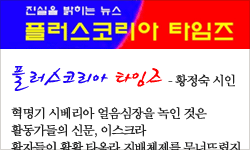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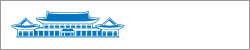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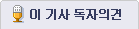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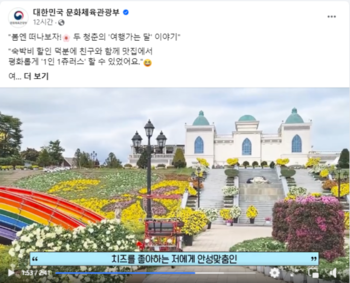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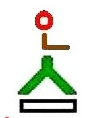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