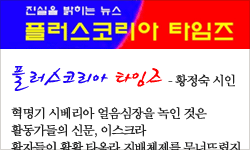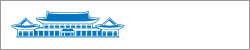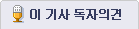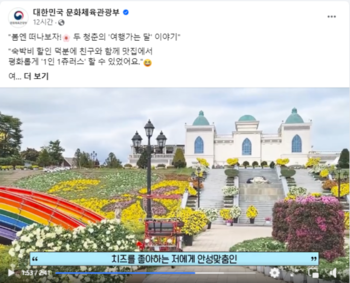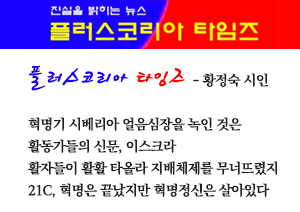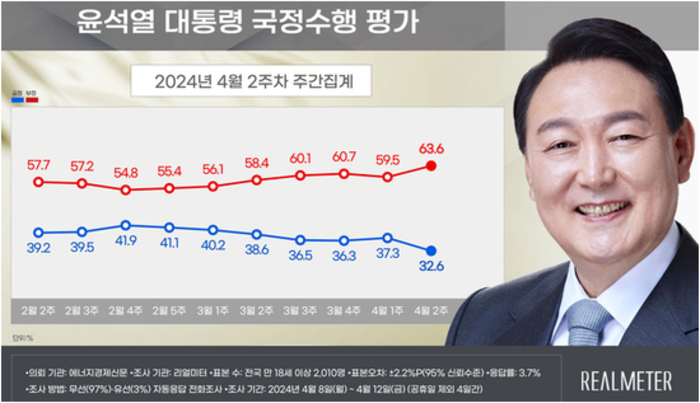|
[임서인의 중편소설] 곳고리 8회
앵초와 사내의 이야기를 다 들은 해덕은 심각한 얼굴로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싸움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그 자신은 종북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의 안주머니에는 교수직을 사표하려는 압력에 그만 견딜 수 없어 흰 봉투가 거친 숨을 헐떡이며 주머니 안에서 뛰쳐나오려 하고 있는 중이었다.
“가자.”
그는 지역감정과 좌,우 이념대립은 꺼지지 않은 불씨여서 두 사람을 뜯어말린다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이 놈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러고 살아야 하노? 사장님, 여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자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니 벌떡 일어났다. 주인여자에게 지갑을 들이밀며 물었다. 주인 여자의 입에서는 업무방해를 한 값을 말하면서도 한숨을 쉬었다. 벌써 대선으로 인해 이런 것을 몇 번 당하고 났다며 빨리 대선이 끝나야 한다고 투덜거렸다.
사내와 여자가 가고 해덕은 앵초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정리를 해주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곳을 나왔다.
젊은 청춘남녀들의 분주한 걸음과 경쾌한 속삭임이 모란 먹자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골목 술집과 음식점에서 새어나오는 청춘남녀들의 술 취한 꿈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모란 골목을 찾은 사람들은 표적을 잃고, 술기운으로 후끈해졌는지 외로움의 목소리보다는 딱딱한 가시돋힌 목소리는 앵초와 사내로 그쳐야 했지만, 어떤 젊은이는 술기운에 견디지 못하여 쪼그리고 앉아 토해내고 있었다. 그들이 이 사회에서 토해내야 할 감정들을 쌓아두고 있으니 위속에 든 음식이라도 대신 쏟아내야 하는 것이었다.
해덕은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이 앉을 곳을 찾았다. 그의 욕망이 꿈틀거리며 취하고 싶었다. 오늘은 기어코 앵초를 달래서 시골로 내려가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의 눈이 술집과 식당 안을 두리번거렸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곳은 없었다.
겨우 동래빈대떡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로 안은 옹색하고 비좁았다. 빈대떡 부친 기름 냄새가 술 냄새와 어울려 코 점막을 자극하며 자꾸만 앵초의 손을 우스러지게 쥐었다 놓고 자리에 앉았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누그러져 있었다. 괴로움도 누그러지고 앞날도 무섭지 않은 당당한 목소리다. 경기침체의 어둔 그늘도 보이지 않고, 젊은이들의 실업의 가시도 박히지 않았다.
술집 안에 창창한 별들이 신통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리/ 사람들은 시도 읊고 있었다.
가정과 사회가 잘 융합하면 좋은데, 어미는 가정을 위하고, 아비는 사회를 위하는 세상이면 딱 좋은데 뒤죽박죽인 세상, 겨울이라도 오늘 같은 날씨만 하여라. 언제였더라 한때 고향에서 처녀의 곱디고운 손을 잡아본 적이, 눈썹이 예쁜 가스나, 달처럼 싸늘한 기운만 감돌던 그녀의 눈동자, 슬픔과 기쁨이 내려앉았다 날았다.
기울인 술잔 속에서 한없이 기어 나오는 꿈틀거리는 추억의 애벌레가 목구멍을 간질거렸다. 술집 안은 온통 추억의 날벌레들이 날고 있었다.
해물 빈대떡을 앵초는 지번지번거렸다. 해덕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말을 짐작하고 있는지 말이 없다. 생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거친 모습을 그에게 보였다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해덕 오빠가 오늘은 웬일로 손을 잡았을까? 저쪽 구석진 테이블에 앉은 두 중년의 애뜻한 눈빛에 총알처럼 그녀의 시선이 꽂혔다. 저런 눈빛과, 남자가 여자의 허벅지에 왼손을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싼다. 여자가 두 눈을 감는다. 남자의 입술이, 저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젊디 젊은 나도 못해본 짓을, 해덕오빠가 저런 짓을 여기에서 한다면 내가 당장 시골로 따라 내려갈 거야.
앵초는 막걸리를 잔에 붓는 그의 손을 본다. 저 손은 나를 향해서 참 인색했지. 작년에 잡아본 손이었다. 전철을 타면서 앵초가 내민 손을 슬며시 뿌리치던 냉정한 손이었다. 두 번 다시 오빠 손을 안 잡을 거야. 입술을 깨물던 이후로 그녀는 그의 손의 감촉을 잊었다.
천안함이 사건이냐? 폭침이냐? 묻고, 새해 아침부터 한국인 아내를 둔 브루스커밍스 이야기를 하고, 강만길,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알라는 말로 새해 덕담을 해주던 그였다.
그는 참 재미없는 인간이었다,
아무리 평범한 회사원이라 하지만 북한의 주사철학이며 마르크스 철학, 북한의 역사며 유물론까지 읽어야 한다고 책을 한보따리 갖다 주었다. 그런 해덕에게 종북주의자니 북한에 가서 살라고 일침을 주었다.
늙은 도령과 말을 하다 보니 해덕이 그동안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에게 그만 젓가락을 휘두르고 말았던 것이다. 늙은 도령에게 -곳고리님, 종복주의자 같아요-라는 말에 화가 났다.
그는 참 재미없는 인간이었다.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서는, 어느 날은 약속이 있다며 만나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던 그가 얼마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쏙 빼고, 오늘은 손도 잡다니……. 오늘 만나면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할참이었다.
해덕은 자기식으로 술취하는 법이 있다. 안주 없이 연거푸 두 잔을 마신다. 막걸리 두 잔을 마시면 그의 눈빛은 따뜻해진다. 가끔 그리스신 같은 웃음을 짓고는 앵초를 말없이 바라보기도 한다. 해덕이 연거푸 두 잔의 술을 마셨다.
“같이 시골에 가자. 너를 안고 별을 세고 싶다. 네가 아니면 안 돼. 오로지 너뿐이야. 하나, 둘씩 사라진 나무를 다시 살려내고, 숲이 울창하면 꾀꼬리 쌍쌍이 날아와 사랑을 하늘 높이 울려댈 것이고, 찾아주는 이, 불러주는 이 없는 외로운 달에게 더불어 사는 기쁨을 주자. 세 가정이 이번에 같이 시골에 가기로 했어. 모두 짝이 있는데, 짝없는 나 혼자 갈수는 없잖니? 앵초야!”
“오빠와 같이 안 갈 거야. 난 여기 도시가 좋아. 휘황찬란한 불빛, 존재감을 알려주는 친구들, 품격을 올려주는 명품 옷,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달콤한 연애, 오빠랑 연애하는 동안 난 즐겁지 않았어. 언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오늘은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 웬일로 그런 말을 해? 언제 나에게 달달한 사랑의 언어를 들려줘 본적이 있느냐고? 가슴 가득 기쁨에 차서 나를 껴안아 본 적이 있어? 명품 목걸이는 아니어도 길거리에서 파는 은반지 하나 사 준 적 없잖아, 난 멋진 연애를 할 거야. 내가 그 늙은 도령이랑 왜 더 싸웠는지 알아? 내가 그 남자에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를 그 남자에게 하고 있었어. 그저 북한은 말이야? 하고 오빠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말이 돼냐고?”
앵초는 울먹거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달콤한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 해덕은 그녀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화가 잔뜩 나서 혼자 정읍으로 내려왔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여자들의 이유있는 분노=임서인 소설가
많이 본 기사
여자들의 이유있는 분노=임서인 소설가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