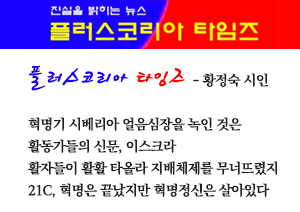내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 집 마당에는 고목이 되어 버린 감나무가 한 그루 있다. 우리 형제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감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며 살아 온 자신의 역사를 증언하듯 한쪽 옆구리가 움푹 패여 흉물스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에게는 친구 이상으로 정다운 존재였다. 여름이면 감나무가 드리워 주는 시원한 그늘에 멍석을 펴고 앉아 책을 읽었다. 금방 쪄 낸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어가며 먹기도 했다. 또 멍석 위에서 맷돌을 돌리는 할머니와 어머니 옆에서 맷돌을 타고 흘러내리는 엿기름가루의 신기한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별다른 놀이 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감나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발 디딘 자욱이 반질거리며 윤이 날 정도로 우리들은 감나무에 자주 올라갔다. 옆구리가 움푹 파인 그 곳은 우리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이기도 하였다. 가령 언니들이 수를 놓고 남은 고운 색실을 줄때가 있었다. 빨강 파랑 노랑의 갖가지 매혹적인 색실에 반쯤 넋이 나가 있다가 어른들이 모르는 우리들만의 비밀의 장소에 깊이 숨겨 놓곤 했다. 이따금 현란한 색실을 몰래 꺼내 보는 즐거움은 어린 소녀에게 은밀하고도 커다란 기쁨이었다. 겨우내 찬바람을 맞으며 추위와 갈증에 허덕이던 감나무는 봄이 되면 신기하게도 물이 올랐다. 앙증맞은 연두 빛 잎눈들이 나무의 거친 표피를 수도 없이 뚫고 나왔다. 참으로 경이로운 풍경이었다. 어린 감잎들은 봄날의 시간이 흐르는 만큼 하루가 다르게 짙푸른 색으로 넓어져 갔다.
여름의 초입에 와서는 작은 봉오리들을 매달기 시작하였다. 작고 도톰한 봉오리들은 소중한 보석을 숨긴 듯 앙증맞게 웅크리고 있다가 예쁜 감꽃을 피웠다. 유월 초순의 어느 아침, 종달새 소리에 잠을 깬 어린 나는 눈을 부비며 방문을 열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감나무 밑에 널려 있는 하얀 감꽃들이었다. 이슬에 살짝 젖은 감꽃들은 싱싱하였다. 얼른 뛰어 나와 줍기 시작하였다. 작은 나의 손에는 어느새 감꽃이 소복이 담겨졌다. 어떤 것은 어린 감을 품고 있는 것도 있었다. 감이 없는 빈 꽃은 감의 성숙을 위해 꽃만 아래로 떨어져 내린 것이다. 감꽃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홀로 남은 작은 감은 조금씩 자라나고 여물어 가을이 되면 먹음직스러운 감으로 변하는 것이다. 홍시가 되기도 하고 더러 곶감이 되기도 한다. 여러 모양으로 변하여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이다. 어린 소녀는 감꽃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싶었다. 어머니의 반짇고리에서 길게 끊어 온 무명실에 감꽃을 꿰기 시작하였다. 감꽃 목걸이를 목에 건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곤 했다. 감꽃 목걸이를 선물하던 한 소년을 생각하였다. 아련한 그리움에 뺨이 붉게 물들고 말았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식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지만 공부를 썩 잘 하는 착한 소년이었다. 또래 여자 아이들이 은근히 좋아하던 소년이었다. 언젠가 내가 감꽃 목걸이를 만들고 있을 때 식이는 아주 길게 늘어 진 감꽃 목걸이를 들고 왔다. 시선을 밑으로 내리 깐 채 “이거……” 들릴 듯 말 듯 한 작은 목소리와 함께 목걸이를 불쑥 내밀었다. “나도 만들고 있는데 뭐 하러 가져 왔노? 내사 필요 없다. 도로 가져 가래이.” 식이는 애써 만들어 온 목걸이를 전해 주지도 못하고 돌아서 갔다. 돌아서 가는 식이의 목덜미가 어제 저녁의 붉은 노을빛과 닮아 있다고 얼핏 생각했다. 식이는 지금 평범한 중년의 모습으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초여름의 감꽃을 볼 때마다 얄밉도록 냉정하던 그 소녀를 떠올릴까? 감꽃은 씹을수록 단 맛이 난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생각해 낼까? 식이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내가 예쁜 소녀로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나 보다. 여전히 오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시절의 어린 나를 본다. 고향 집 감나무는 이제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는다. 그리고 감도 열리지 않는다. 고목이 되어 버렸다. 단지 바람에 나풀거리는 잎사귀만 몇 개 매단 채 자신의 존재를 알릴뿐이다. 감나무를 기어오르며 재미있게 놀던 아이들은 마흔을 넘긴 중년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무더운 여름에도 그늘 밑으로 들어 와 볕을 피하는 사람이 없다. 감나무 아래 누워 반쯤 눈을 감고 되새김질 하던 누렁이 암소도 보이지 않는다. 긴 꼬리를 휘둘러 등에 앉은 파리를 쫒기도 하던 누렁이의 순박하리만치 큰 눈망울을 감나무는 기억하고 있을까?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옛 모습을 지닌 것이 없건만, 고향 집 마당의 늙은 감나무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 여름엔 꼭 고향에 다녀와야겠다. 인기척 없던 집에 사람 냄새도 나게 하고 감나무의 외로운 등허리를 한 번 쯤 와락 껴안아 주고 오리라. 몇 잎 달리지 않은 감나무 잎이 행여 한 장이라도 떨어 져 있다면 침을 발라 글씨를 쓴 후 흙을 뿌려 보리라. 유년의 추억에 설핏 마음 글썽여도 보리라. ▽ 최영옥 프로필 慶北 慶州 출생 계간 문학세상 詩 등단 한국 예총 예술세계 수필 등단 예술시대작가회회원 동작문인협회회원 現 동서울 교회 신문 편집장 시집 “사람아 사람아”(2007년 푸른 사상) e mail/ogi1026@naver.com breaknews(원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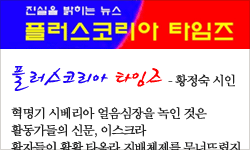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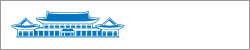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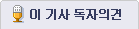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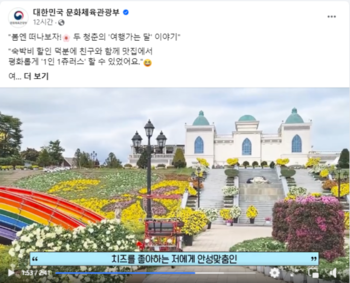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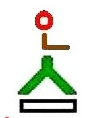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