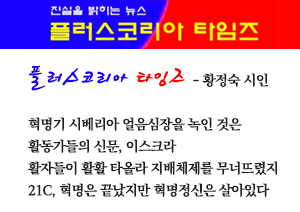|
<박종규 단편소설> 초 록 반 지 (5회)
“짧은 훈련기간이지만 난, 나름대로 귀관들에게 정말 장교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싶었다.”
구대장은 장승이 되어, 로봇이 되어 입술만 움직이고 있다. 대원들은 너무 의외의 장면에 어리둥절한 모습이고, 웅성거림이 차츰 뒷 열로 전파된다. 한영수 후보생은 눈을 두리번거리며 주변 동료의 표정 읽기에 바쁘다.
“저 인간이 그럼…….”
“자식! 멋진 구석이 있었네!”
그랬다. 김 중위는 평소 오른손에 청색 반지를 끼고 있었다. 미친놈이 반지를 왜 오른손에 끼고 지랄일까 투덜대는 후보생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왼손가락에 장교 반지를 껴 주의를 집중시켰고, 이제까지 보았던 청색 반지 대신 초록색 반지가 반짝이고 있다.
물론 뒷줄의 대원들은 미쳐 눈치를 못 챘을 것이나, 앞의 대원들은 그 반지의 색깔이 변해있는 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김 중위는 반지의 색깔이 가로등에 드러나도록 교묘하게 손을 놀리며 말을 잇고 있다.
“이렇게 비바람이 거센 저녁, 밤잠을 설치게 하는 집합은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 생각하면 훈련도 즐거움이 된다. 내 기억으로는 훈련이 고될수록 좋은 추억이 되었다. 이 말은 바로 2년 전 내가 선배 장교에게서도 들은 말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나 대신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다. 내 말 알아들었나?”
김 중위는 턱을 높이 들며 차갑게 말꼬리를 올린다.
“예!”
자발적인 의지가 들어가서인지 대답 소리가 우렁차게 한 소리로 모아져 하늘로 솟는다. 소위 기합이 들어간 소리다. 이 소리는 뒤쪽 대원들까지 김 중위의 초록 반지를 인식했다는 신호이고, 김 중위에 대한 적대감이 바뀌었다는 함성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김 중위는 번뜩이는 눈초리로 대원들을 둘러보면서 한 호흡을 쉬더니 말을 잇는다.
“대한민국 장교는 다 같은 장교다. 출신을 따지는 것은 시대 흐름을 역행시키는 졸렬한 발상이다. 우리의 교육훈련기간은 타 출신보다 짧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출신들에게서 배울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행동 이전에 그런 마음 자세를 반드시 가지란 말이다.”
그렇긴 했다. 당연한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다. 사회에서의 엘리트 의식을 군에서도 같이 통용시키려 했다. 구대장은 몸으로 그것을 입증해 준 셈이다. 뒷줄에서 누군가가 손뼉을 친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손뼉 소리를 보탠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츰 손뼉 소리가 커지더니 모두가 손뼉을 쳐댄다.
“해산.”
구대장의 짧은 한 마디는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비바람까지 잠재우는 듯 장대비가 주춤거린다. 대열이 흐트러질 때다.
“구대장님, 면담 좀…….”
유대관 후보생이 불쑥 앞으로 나선다. 김 중위는 녀석에게 잠시 눈길을 주더니 검지를 구부려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며 장교 막사로 향한다. 우린 잠시 그 자리에서 박수를 계속 보낸다. 이젠 구대장을 혼내자던 녀석들의 표정에서 어떤 적의도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야릇한 낭패감을 느꼈으리라. 급기야 바람이 세지면서 빗줄기는 더욱 세차게 뺨을 후린다. 그러나 그 빗줄기는 더는 싫지 않은 한여름 밤의 소나기가 되어 있었다.
유대관 후보생은 구대장을 쫓아 들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이젠 아닌데… 녀석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윽고 십여 분 뒤 대관이는 씩씩하게 막사로 돌아온다. 얼굴에 화색이 돈다.
“뭐 하러 갔었어? 그래, 한 대 올려주기라도 한 거야?” “모자 벗은 모습을 봤지. 우리 구대장 대머리도 아니고, 잘 생겼던데! 그 김 중위 말이야, 바로 우리 학교 선배였어! 내가 어떻게 주먹질을 하겠어?”
“그래?”
이 녀석 김 중위에 대한 호칭이 아주 달라져 있다. 한영수 후보생은 아무 말 없이 피식 웃고만 있고, 모포 자락에 감긴 나의 몸은 스르르 잠 속으로 함몰되고 있다. 천둥 번개가 요란했던 빗속에서 차갑게 빛나던 초록 반지, 눌러 쓴 모자챙에 숨겨져 반짝거리던 김 중위의 눈동자! 모두 한여름 밤의 꿈이었을까. 언제부터였는지 빗소리가 멈춘 막사에 숨 막히는 고요가 찾아들었다. <끝>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규 관련기사목록
|
연재
많이 본 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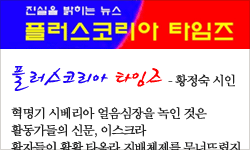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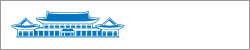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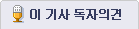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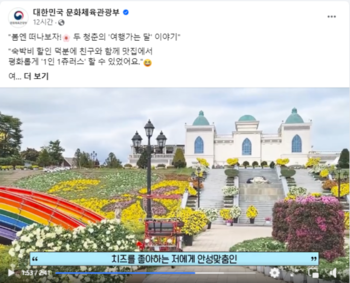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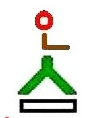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